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性)’, 즉 생식이 왜 생겨났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보통 성의 가장 큰 장점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꼽는데요.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 만나서 유전 정보를 섞으면, 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체가 태어나고, 그중에서 환경에 더 적합한 개체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영국 요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성이 처음 등장한 이유는 단순히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살기 힘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성은 ‘유전자 믹스’가 아니라 ‘몸집 불리기’에서 시작됐다?
보통 단세포 생물들은 주변 환경이 좋을 때는 그냥 세포 분열을 하면서 증식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갑자기 나빠져서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되면, 놀랍게도 서로 합쳐져서 더 큰 세포를 만들기도 하죠.

예를 들면 ‘클라미도모나스’라는 녹조류는 영양이 부족해지면 ‘성’의 스위치가 켜지면서 서로 결합해 튼튼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미생물들은 이렇게까지 해서 몸집을 키우려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있습니다. ‘몸집이 크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단세포 생물이 서로 합쳐져 덩치를 키우는 것 자체가 생존율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성의 기원은 단순히 유전자를 섞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원을 합치고 몸집을 키우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수학 모델로 본 ‘몸집 키우기의 효과’
그럼 이 가설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연구팀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에서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했죠:
- 세포가 몇 번 분열해서 몇 개의 작은 자식 세포를 만드는가?
- 자식 세포들이 얼마나 자주 서로 융합하는가?
- 환경이 얼마나 혹독한가?
그 결과, 환경이 좋을 때는 세포들이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세포들이 빠르게 합쳐지는 전략을 선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세포가 융합하는 과정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 실패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극도로 나빠지면 여전히 융합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유전적 다양성을 늘리는 것보다, ‘몸집을 키워 환경을 버티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한 전략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생물들의 생존 전략과 닮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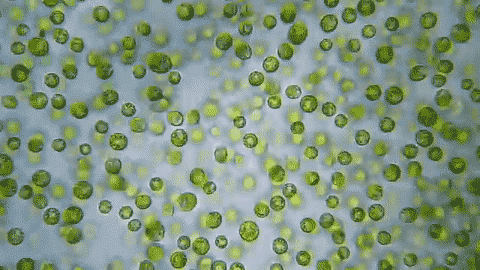
이런 생존 방식은 현재의 여러 단세포 생물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 클라미도모나스: 환경이 좋을 때는 그냥 세포 분열을 하지만, 영양 부족 상태가 되면 세포끼리 합쳐져서 생존에 유리한 형태로 변화됩니다.
- 효모(Yeast):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세포가 서로 결합해 더 튼튼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런 전략은 다세포 생물이 등장하는 과정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원래 단세포 생물들이 혼자 살다가, ‘힘을 합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의 개념이 바뀔 수도?

이번 연구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성(생식)의 개념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습니다.
그동안 성이 생겨난 이유를 ‘유전적 다양성 확보’라고만 생각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집 키우기’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자원이 부족할 때는 합쳐서 크고 강하게!”라는 전략이 처음에 성을 만들어낸 핵심 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과학자들은 세포 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융합 후의 문제(핵이 충돌한다든지, 에너지 소모가 커지는 문제 등)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연구가 더 발전하면, 단순한 단세포 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의 생식 방식이 왜 이렇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극한 상황에서는 함께 뭉쳐야 살아남는 본능이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자연 속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고 있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
'지구・ 생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기생충 10..이런게 진짜 존재한다고? ㄷㄷ(열람주의) (0) | 2025.03.16 |
|---|---|
| 지구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드디어 밝혀진 진실. (0) | 2025.03.15 |
| 과학자들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 순위. 10위부터 1위까지 (1) | 2025.03.10 |
|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공룡에 대한 15가지 사실들! (0) | 2025.03.10 |
| 과학자들은 42억 년 전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고도로 진화되어 있었습니다. (2) | 2025.03.01 |




